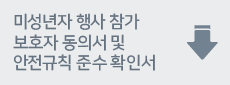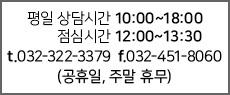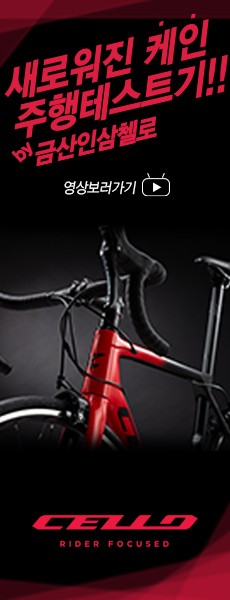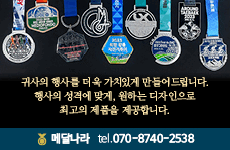고성 메디오폰도 코스 – 준비와 도전
고성 메디오폰도 코스 – 준비와 도전
8월 30일 고성 그란폰도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일은 점점 많아졌고, 회사 직원이 한 달 동안 수술로 결근한다고 했다.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내가 맡기로 했다. 직원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 처리했다. 용접한 탱크의 산처리와 포장, 호스건 작업 등이었다. 쉬는 날에도 출근해 용접을 마무리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한강에서 30km를 달리며 몸을 풀었다. 짬짬이 하오고개와 청계사, 망해암을 오르며 업힐 훈련을 했다. 안양에서 고성까지는 약 200km, 세 시간 거리였다. 시합 전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고성 소똥령 이야기펜션으로 향했다.
길은 막혔고, 서울을 빠져나가는 일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그렇게 더디게 가는 길도 삶의 일부였다. 펜션에 도착하니 밤 9시 30분. 어둠 속의 펜션은 고요했다. 늦은 도착으로 끼니를 거른 우리에게 안주인은 라면과 김치를 내주었다. 김치의 생생한 맛은 그 순간 삶이 건네준 선물 같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오늘 달릴 코스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완주의 여부가 아니라, 삶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운동장에 도착해 기록칩과 번호표를 부착했다. 자전거는 나의 몸을 확장한 도구였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삶을 견뎌낼 나의 두 번째 다리였다.
총 거리: 63.83km
누적 고도: 870m
제한 시간: 4시간 (11:30 컷오프)
출발/도착: 고성종합운동장
코스 초반은 평지와 완만한 업다운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달리며 파도와 산이 교차하는 풍경을 마주했다. 파도는 밀려왔다 사라지고, 다시 밀려왔다 사라졌다. 그 무심한 반복 속에서 나는 문득 ‘삶도 파도와 같구나’ 생각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고성 팔경 중 건봉사, 화진포, 통일전망대가 길 위에 있었다. 특히 통일전망대는 인간이 만든 경계와 긴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였다. 산과 바다,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흐린 시야는 현실의 분단처럼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실감났다. “국경은 인간이 그어 놓은 선일 뿐, 바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화진포는 둘레 16km의 호수였다. 해당화가 만발한 호숫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쌓여 있었다. 인간의 삶은 덧없이 짧지만, 자연은 묵묵히 이어졌다.
35km 지점에서 업힐이 시작되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고통은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통은 내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였다. 두 번째 업힐에서는 ‘체력의 한계와 정신의 힘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왔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대회의 백미는 ‘건봉사 업힐’이었다. 단순한 오르막이 아니라 KOM(킹 오브 마운틴) 구간이 설정된 경쟁 코스였다. 이 구간은 라이더들에게 체력과 전략을 동시에 요구했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만큼 짜릿한 순간, 라이더들은 누가 진정한 산의 주인인지 겨루며 달렸다.
건봉사는 단순히 산사(山寺)가 아니었다. 신라 시대에 창건된 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왕실의 원당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아 일본군에 맞섰던 호국의 중심지였다.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모여 독립의 뜻을 세우고 싸웠던 장소이기도 했다. 그 긴 역사를 알고 업힐을 오르니, 단순한 체력의 시험이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달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길은 계속 이어졌다. 업힐과 다운힐, 그리고 다시 평지.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사실 내가 달린 건 길 위가 아니라 내 안의 의심과 두려움이었다. 곁을 스쳐가는 라이더들과 잠시 말을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달리는 순간만큼은 동료이자 친구였다.
결승선을 통과하며 깨달았다. 이 코스는 단순한 63.83km가 아니었다. 오르막은 나를 시험했고, 내리막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바람은 때로는 벽이었고, 때로는 날개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는 길 위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났다.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낸 증거로서의 메디오폰도. 그것이 내가 달린 이유였다.
8월 30일 고성 그란폰도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일은 점점 많아졌고, 회사 직원이 한 달 동안 수술로 결근한다고 했다.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내가 맡기로 했다. 직원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 처리했다. 용접한 탱크의 산처리와 포장, 호스건 작업 등이었다. 쉬는 날에도 출근해 용접을 마무리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한강에서 30km를 달리며 몸을 풀었다. 짬짬이 하오고개와 청계사, 망해암을 오르며 업힐 훈련을 했다. 안양에서 고성까지는 약 200km, 세 시간 거리였다. 시합 전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고성 소똥령 이야기펜션으로 향했다.
길은 막혔고, 서울을 빠져나가는 일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그렇게 더디게 가는 길도 삶의 일부였다. 펜션에 도착하니 밤 9시 30분. 어둠 속의 펜션은 고요했다. 늦은 도착으로 끼니를 거른 우리에게 안주인은 라면과 김치를 내주었다. 김치의 생생한 맛은 그 순간 삶이 건네준 선물 같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오늘 달릴 코스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완주의 여부가 아니라, 삶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운동장에 도착해 기록칩과 번호표를 부착했다. 자전거는 나의 몸을 확장한 도구였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삶을 견뎌낼 나의 두 번째 다리였다.
총 거리: 63.83km
누적 고도: 870m
제한 시간: 4시간 (11:30 컷오프)
출발/도착: 고성종합운동장
코스 초반은 평지와 완만한 업다운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달리며 파도와 산이 교차하는 풍경을 마주했다. 파도는 밀려왔다 사라지고, 다시 밀려왔다 사라졌다. 그 무심한 반복 속에서 나는 문득 ‘삶도 파도와 같구나’ 생각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고성 팔경 중 건봉사, 화진포, 통일전망대가 길 위에 있었다. 특히 통일전망대는 인간이 만든 경계와 긴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였다. 산과 바다,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흐린 시야는 현실의 분단처럼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실감났다. “국경은 인간이 그어 놓은 선일 뿐, 바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화진포는 둘레 16km의 호수였다. 해당화가 만발한 호숫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쌓여 있었다. 인간의 삶은 덧없이 짧지만, 자연은 묵묵히 이어졌다.
35km 지점에서 업힐이 시작되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고통은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통은 내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였다. 두 번째 업힐에서는 ‘체력의 한계와 정신의 힘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왔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대회의 백미는 ‘건봉사 업힐’이었다. 단순한 오르막이 아니라 KOM(킹 오브 마운틴) 구간이 설정된 경쟁 코스였다. 이 구간은 라이더들에게 체력과 전략을 동시에 요구했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만큼 짜릿한 순간, 라이더들은 누가 진정한 산의 주인인지 겨루며 달렸다.
건봉사는 단순히 산사(山寺)가 아니었다. 신라 시대에 창건된 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왕실의 원당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아 일본군에 맞섰던 호국의 중심지였다.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모여 독립의 뜻을 세우고 싸웠던 장소이기도 했다. 그 긴 역사를 알고 업힐을 오르니, 단순한 체력의 시험이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달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길은 계속 이어졌다. 업힐과 다운힐, 그리고 다시 평지.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사실 내가 달린 건 길 위가 아니라 내 안의 의심과 두려움이었다. 곁을 스쳐가는 라이더들과 잠시 말을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달리는 순간만큼은 동료이자 친구였다.
결승선을 통과하며 깨달았다. 이 코스는 단순한 63.83km가 아니었다. 오르막은 나를 시험했고, 내리막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바람은 때로는 벽이었고, 때로는 날개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는 길 위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났다.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낸 증거로서의 메디오폰도. 그것이 내가 달린 이유였다.
멋진 사진 부탁드립니다. 더 바이크 화이팅. 갑장 누님도 화이팅. 멋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