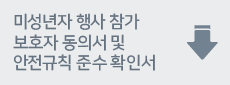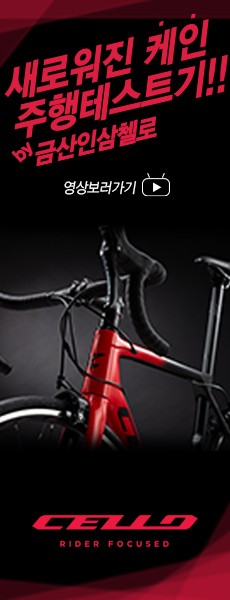무주 메디아폰도를 다녀와서- 나제통문을 지나
오랜만에 맑은 날이 이어졌다. 고성 메디아 폰도 대회에 이어 바로 접수한 대회는 무주 메디아 폰도였다. 그날이 9월 9일이었다.
그런데 10월 31일 금요일, 대회 하루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니 내 이름이 명단에 없었다. 전북 자전거연맹에 추가 명단을 제출한 끝에 간신히 출전이 허락되었다.
무틉(MTB)은 모아 용평, 왕방산, 여주 크리테리움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산악 전형이던 무틉 세팅을 아스팔트 길 장거리 라이딩에 맞게 바꾸었다.
타이어는 가장 가벼운 맥시스 310으로, 튜브는 일반 고무 대신 TPR로 교체했다.
줄이지 못한 건 내 몸무게였고, 대신 줄일 수 있는 건 자전거의 무게뿐이었다.
수요일과 금요일,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청계사로 향했다. 가파른 업힐에서 숨은 거칠고 다리는 무거웠다. 올 8월부터 다시 자전거를 시작했으니 부족한 게 당연했다. 그저 꾸준히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11월 1일 토요일 새벽 세 시, 어둠을 뚫고 무주로 향했다. 청주 부근에 도착하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오늘은 가을비를 맞으며 달려야 하나?’ 불안이 앞섰다.
아침 여섯 시, 무주 등나무 체육공원에 도착했다. 일곱 시가 되자 하늘이 열리며 어둠이 걷혔다. 전북 자전거 연맹 관계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임시 번호판을 받아 자전거 싯 포스트에 칩과 번호표를 등에 배번을 달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라이더들은 이곳저곳에서 팀별로 모여 사진을 찍었다. 대회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축제와 같았다.
여덟 시, 교통 통제, 안전을 책임지고 라이딩 선두를 인도할 모토 마샬들이 집결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사진을 찍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굼디 사진작가님이었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예전에 내 자전거를 굼디님의 샵에서 허브 베어링을 세라믹으로 교체했었다.
짧은 인사를 나누는 순간,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출발선 앞에는 날렵한 로드 자전거들이 줄지어 섰다. 가볍게 다이어트를 마친 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내 무틉에는 빼지 못한 군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정비하던 기사가 “후미등은 빼세요”라며 웃었다. 나는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몸도 무겁고, 자전거도 무거웠다. 물통도 꼭지까지 물이 차있었다. 출발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서서히 고동쳤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바람은 심하게 불었지만 완벽히 맑은 날이었다.
무틉과의 첫 만남은 2003년이었다. 바쁜 회사 일 때문에 틈을 낼 수가 없었다. 해외 출장 중에 친한 거래처 사장의 권유로 자전거에 입문했다. 나는 전기 튀김기를 만드는 엔지니어이다. 제조업으로 삶을 지탱해가는 입장에서 자전거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타이어를 갈고, 부품을 수리하고 정교한 장치들을 볼 때마다 묘하게 끌렸다. 굼디 사장님이 허브 베어링을 수리할 때의 정교함, 체인 링크의 오차는 0.01mm, 기어 각도는 5도,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작은 기어들, 이런 정밀한 기계도 사람의 손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보인다. 기계와 인간의 합주는, 이런 대회에서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스스로 설 수 없지만 그 위에 사람이 앉아 달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된다.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 기구가 아니다. 기계적 정밀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이 맞물려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쇠와 근육, 탄소와 혈관이 같은 리듬으로 진동한다. ‘기계는 인간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가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기쁨의 본질이다.
무주는 이번 자전거 대회로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무주 지역의 ‘나제통문‘ 이란 낳선 글, 생소한 이름을 듣게 되었다.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터널형 통로로, 과거에는 단순한 고갯길이었다. 지금은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이지만, 그 속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나제통문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경계였다고 한다. 백제와 신라의 국호가 들어가 두 나라를 통하는 문이란 뜻이라 생각했다. 이 문을 경계로 지금도 양쪽 지역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고 한다. 이 굴이 길이 된 것은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에 금광 개발과 도로 개설을 위해 뚫린 것이다. 숲과 계곡, 바위 절벽이 어우러져 구천동 33경 중 1경에 꼽힌다.
무풍 분지는 무주군 무풍면 지역에 형성된 분지를 말하는데 철, 구리, 은이 풍부했던 지역이다. 신라·가야·백제 시대의 제철 유적이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 오늘 라이딩 코스이기도 하다.
출발 신호와 함께 사이클 선수들이 먼저 출발했다. 나는 MTB라 후미에서 조용히 출발했다. 시내 중심부를 지나 당산 삼거리와 소천교를 향해 달렸다.
완만한 언덕과 계곡, 농촌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었다. ‘반디랜드’를 알리는 간판이 자주 보였다. 무주 설천면 청량리에 조성된 자연 생태 체험공원으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322호이다.
1차 보급지는 출발지에서 22km 지점이었다. 바나나 하나, 생수 한 모금을 마셨다. 지친 몸을 잠시 쉬고 곧바로 출발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었다. 오두재는 끝없이 이어졌다. 35km 지점부터 36km 구간은 KOM 구간이다. 그 길 끝에는 덕지삼거 터널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 터널이 없어 옛길을 넘어야 했다. 시상 구간인 KOM 코스는 내게 혹독했다. 업힐이 약한 나에겐 숨이 아닌 의지의 시험이었다.
덕지삼거 터널을 지나며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설계된 듯 펼쳐졌다. 자연은 언제나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했다. 길 좌우로 늘어선 주목나무는 천 년을 버티며 ‘강철보다 단단한 유연함’을 보여주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버티온 세월은 인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정밀한 기계가 세상을 바꾼다면, 자연은 침묵으로 세상을 완성한다.”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선 나는, 무틉이라는 자전거로 땅과 하늘,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끝없는 내리막 같던 길은 어느 순간 낙타등처럼 굽이쳤고, 속도는 다시 나를 멈춰 세웠다.
2차 보급은 출발지에서 37.95km 두제터널 입구에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기억해 보면 콤 구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운하는 길은 곧게 뻗은 나무들과 흐르는 개울이 가을빛을 더했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달렸다.
다시 나제통문을 지나고, 반디랜드를 지나며 생각했다. 이 길 위로 백제의 장정들이, 신라의 선비들이, 제철의 장인들이, 그리고 일제의 군인들이 지나갔을 것이다. 오늘은 그 위를 라이더들이 달렸다.
시마노의 정밀함은 일본의 자본으로, 대만의 기술은 철보다 가벼운 카본으로 완성되었다.디티 스위스의 바퀴는 스위스, 대만, 폴란드의 기술이 섞여 있다.
한 대의 자전거에 세계의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 과거의 장인들이 쇳덩이를 벼려 전쟁에 필요한 물자인 검과 창 방패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자전거 기술자는 탄소섬유를 다듬어 자유를 만들었다.
역사의 장정들은 싸리재 고개를 짐 지고 넘었지만, 나는 오늘 카본 자전거로 그 길을 달렸다. 신라의 후예인 내가 지금, 백제의 역사 속으로 타고 들어가고 있다. 수천 겹의 시간이 이 길 위에 겹쳐졌고, 땅은 그 모든 바큇자국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저 멀리 결승선이 보였다. 남은 힘을 끌어모아 달렸다.무틉을 타면서 펠로톤을 이루지 못했다.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홀로 달렸다. 사고 없이 완주해서 기쁘다. 오늘은 깊은 잠에 들고 싶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증명이며, 기계와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하는 행위였다.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세상의 저항에 맞서는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방식이라 생각했다.
속도를 낸다는 것은 곧, 시간을 통과하는 일이었다. 달리면서 인간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살아간다. 자전거는 인간이 만든 가장 시적인 기계이다. 엔진 대신 심장을, 연료 대신 의지를 쓴다.
그 바퀴는 과거의 노동과 현재의 열정을, 그리고 미래의 꿈을 함께 굴린다. 오늘 무주 라이딩은 시간의 문턱을 넘어, 나 자신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통과의례였다.
총거리 약 95.6km 고도 1,533m 3번의 보급으로 무사히 완주했다.
그런데 10월 31일 금요일, 대회 하루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니 내 이름이 명단에 없었다. 전북 자전거연맹에 추가 명단을 제출한 끝에 간신히 출전이 허락되었다.
무틉(MTB)은 모아 용평, 왕방산, 여주 크리테리움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산악 전형이던 무틉 세팅을 아스팔트 길 장거리 라이딩에 맞게 바꾸었다.
타이어는 가장 가벼운 맥시스 310으로, 튜브는 일반 고무 대신 TPR로 교체했다.
줄이지 못한 건 내 몸무게였고, 대신 줄일 수 있는 건 자전거의 무게뿐이었다.
수요일과 금요일,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청계사로 향했다. 가파른 업힐에서 숨은 거칠고 다리는 무거웠다. 올 8월부터 다시 자전거를 시작했으니 부족한 게 당연했다. 그저 꾸준히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11월 1일 토요일 새벽 세 시, 어둠을 뚫고 무주로 향했다. 청주 부근에 도착하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오늘은 가을비를 맞으며 달려야 하나?’ 불안이 앞섰다.
아침 여섯 시, 무주 등나무 체육공원에 도착했다. 일곱 시가 되자 하늘이 열리며 어둠이 걷혔다. 전북 자전거 연맹 관계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임시 번호판을 받아 자전거 싯 포스트에 칩과 번호표를 등에 배번을 달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라이더들은 이곳저곳에서 팀별로 모여 사진을 찍었다. 대회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축제와 같았다.
여덟 시, 교통 통제, 안전을 책임지고 라이딩 선두를 인도할 모토 마샬들이 집결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사진을 찍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굼디 사진작가님이었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예전에 내 자전거를 굼디님의 샵에서 허브 베어링을 세라믹으로 교체했었다.
짧은 인사를 나누는 순간,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출발선 앞에는 날렵한 로드 자전거들이 줄지어 섰다. 가볍게 다이어트를 마친 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내 무틉에는 빼지 못한 군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정비하던 기사가 “후미등은 빼세요”라며 웃었다. 나는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몸도 무겁고, 자전거도 무거웠다. 물통도 꼭지까지 물이 차있었다. 출발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서서히 고동쳤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바람은 심하게 불었지만 완벽히 맑은 날이었다.
무틉과의 첫 만남은 2003년이었다. 바쁜 회사 일 때문에 틈을 낼 수가 없었다. 해외 출장 중에 친한 거래처 사장의 권유로 자전거에 입문했다. 나는 전기 튀김기를 만드는 엔지니어이다. 제조업으로 삶을 지탱해가는 입장에서 자전거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타이어를 갈고, 부품을 수리하고 정교한 장치들을 볼 때마다 묘하게 끌렸다. 굼디 사장님이 허브 베어링을 수리할 때의 정교함, 체인 링크의 오차는 0.01mm, 기어 각도는 5도,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작은 기어들, 이런 정밀한 기계도 사람의 손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보인다. 기계와 인간의 합주는, 이런 대회에서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스스로 설 수 없지만 그 위에 사람이 앉아 달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된다.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 기구가 아니다. 기계적 정밀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이 맞물려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쇠와 근육, 탄소와 혈관이 같은 리듬으로 진동한다. ‘기계는 인간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가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기쁨의 본질이다.
무주는 이번 자전거 대회로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무주 지역의 ‘나제통문‘ 이란 낳선 글, 생소한 이름을 듣게 되었다.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터널형 통로로, 과거에는 단순한 고갯길이었다. 지금은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이지만, 그 속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나제통문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경계였다고 한다. 백제와 신라의 국호가 들어가 두 나라를 통하는 문이란 뜻이라 생각했다. 이 문을 경계로 지금도 양쪽 지역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고 한다. 이 굴이 길이 된 것은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에 금광 개발과 도로 개설을 위해 뚫린 것이다. 숲과 계곡, 바위 절벽이 어우러져 구천동 33경 중 1경에 꼽힌다.
무풍 분지는 무주군 무풍면 지역에 형성된 분지를 말하는데 철, 구리, 은이 풍부했던 지역이다. 신라·가야·백제 시대의 제철 유적이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 오늘 라이딩 코스이기도 하다.
출발 신호와 함께 사이클 선수들이 먼저 출발했다. 나는 MTB라 후미에서 조용히 출발했다. 시내 중심부를 지나 당산 삼거리와 소천교를 향해 달렸다.
완만한 언덕과 계곡, 농촌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었다. ‘반디랜드’를 알리는 간판이 자주 보였다. 무주 설천면 청량리에 조성된 자연 생태 체험공원으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322호이다.
1차 보급지는 출발지에서 22km 지점이었다. 바나나 하나, 생수 한 모금을 마셨다. 지친 몸을 잠시 쉬고 곧바로 출발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었다. 오두재는 끝없이 이어졌다. 35km 지점부터 36km 구간은 KOM 구간이다. 그 길 끝에는 덕지삼거 터널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 터널이 없어 옛길을 넘어야 했다. 시상 구간인 KOM 코스는 내게 혹독했다. 업힐이 약한 나에겐 숨이 아닌 의지의 시험이었다.
덕지삼거 터널을 지나며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설계된 듯 펼쳐졌다. 자연은 언제나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했다. 길 좌우로 늘어선 주목나무는 천 년을 버티며 ‘강철보다 단단한 유연함’을 보여주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버티온 세월은 인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정밀한 기계가 세상을 바꾼다면, 자연은 침묵으로 세상을 완성한다.”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선 나는, 무틉이라는 자전거로 땅과 하늘,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끝없는 내리막 같던 길은 어느 순간 낙타등처럼 굽이쳤고, 속도는 다시 나를 멈춰 세웠다.
2차 보급은 출발지에서 37.95km 두제터널 입구에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기억해 보면 콤 구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운하는 길은 곧게 뻗은 나무들과 흐르는 개울이 가을빛을 더했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달렸다.
다시 나제통문을 지나고, 반디랜드를 지나며 생각했다. 이 길 위로 백제의 장정들이, 신라의 선비들이, 제철의 장인들이, 그리고 일제의 군인들이 지나갔을 것이다. 오늘은 그 위를 라이더들이 달렸다.
시마노의 정밀함은 일본의 자본으로, 대만의 기술은 철보다 가벼운 카본으로 완성되었다.디티 스위스의 바퀴는 스위스, 대만, 폴란드의 기술이 섞여 있다.
한 대의 자전거에 세계의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 과거의 장인들이 쇳덩이를 벼려 전쟁에 필요한 물자인 검과 창 방패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자전거 기술자는 탄소섬유를 다듬어 자유를 만들었다.
역사의 장정들은 싸리재 고개를 짐 지고 넘었지만, 나는 오늘 카본 자전거로 그 길을 달렸다. 신라의 후예인 내가 지금, 백제의 역사 속으로 타고 들어가고 있다. 수천 겹의 시간이 이 길 위에 겹쳐졌고, 땅은 그 모든 바큇자국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저 멀리 결승선이 보였다. 남은 힘을 끌어모아 달렸다.무틉을 타면서 펠로톤을 이루지 못했다.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홀로 달렸다. 사고 없이 완주해서 기쁘다. 오늘은 깊은 잠에 들고 싶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증명이며, 기계와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하는 행위였다.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세상의 저항에 맞서는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방식이라 생각했다.
속도를 낸다는 것은 곧, 시간을 통과하는 일이었다. 달리면서 인간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살아간다. 자전거는 인간이 만든 가장 시적인 기계이다. 엔진 대신 심장을, 연료 대신 의지를 쓴다.
그 바퀴는 과거의 노동과 현재의 열정을, 그리고 미래의 꿈을 함께 굴린다. 오늘 무주 라이딩은 시간의 문턱을 넘어, 나 자신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통과의례였다.
총거리 약 95.6km 고도 1,533m 3번의 보급으로 무사히 완주했다.
헐 ???? 글 속에 사진 넣어주세요.
사람목을 자르면 어쩝니까? ㅋㅋ
댓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