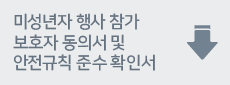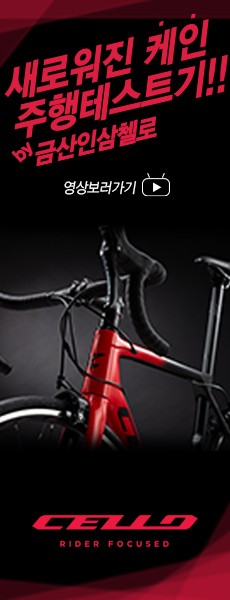서해의 바람을 달리다 – 덕적도에서 역사를 넘다
서해의 바람을 달리다 – 덕적도에서 역사를 넘다
7월 14일, 갑작스레 자전거 여행에 신청했다. 일정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며칠 남지 않은 준비 기간, 마음이 분주해졌다. 때 아닌 폭우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대전·광주·목포·산청 등 남부 지방 곳곳은 물에 잠겼다.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에 뉴스는 연일 피해 상황을 전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밤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잠 못 이루었다. 이 여행은 나 혼자가 아니라 중학생 아들과 함께 떠나는 여정이었다. 목적지는 인천 옹진군의 섬, 덕적도. 섬길을 따라 달리는 이틀 간의 자전거 퍼레이드. 혼자라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도 아들과 함께라면 달랐다. 불안은 점점 커졌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러나 결국 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여행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이 되기를 바랐다. 7월 18일 아침, 아들과 함께 안산의 공장으로 향했다. 거기 보관해 두었던 자전거를 실어 대부도 여객 터미널로 이동했다.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아직 배는 떠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부슬 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대합실에 모인 라이더들의 웃음 덕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배에 자전거를 싣고, 덕적도로 향했다. 서해 바다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멀리 보이는 섬들이 수묵화처럼 떠 있었다. 한 시간 사십 분 동안의 항해 끝에 섬에 도착했다. 비는 여전했지만, 나와 아들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덕적도는 인천에서 약 49km 떨어진 섬이다. 조용한 어촌 같지만, 이곳은 역사 속 전쟁의 전초기지였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길목에 자리했던 이 섬은 해군이 ‘엑스레이 작전’의 일환으로 탈환했던 곳이다. 당시 아무런 저항 없이 상륙한 해군은, 민간인 수색 중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다. 임신부와 아이를 포함해 최소 41명이 희생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 역사의 섬을 달렸다.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땀과 눈물, 생존과 저항이 켜켜이 쌓인 길이었다. 골목을 지나며, 바퀴는 시간의 층위를 밟아갔다. ‘덕적’이라는 이름처럼, 이 섬엔 덕(德)이 살아 있었다. 수군의 거점이었고, 어민의 삶터였으며, 정찰과 상륙의 무대였다. 함께 달리던 아들 상준은 첫 언덕에서 기어 변속을 놓쳐 ‘끌바’를 해야 했다. 뒤에서 지켜보며 기어 사용을 조언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달렸다. 언덕에서는 기어를 가볍게 조정했고,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조절했다. 긴장과 함께 걱정도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첫날의 라이딩은 덕적 선착장에서 시작해 덕적종합운동장에서 마쳤다. 길은 해변을 따라 이어졌다. 진리 해변, 밧지름 해변, 그리고 마지막엔 서포리 해변까지.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과거 해병 정찰대와 KLO 부대가 위장 침투와 상륙 훈련을 벌이던 전진 기지였다. 파도가 부서지던 모래 사장은, 오래전 작전의 비밀을 아직 품고 있는 듯 조용했다. 숙소는 비치사랑펜션이었다. 순박한 사장님 내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함께 묵은 동료 라이더들과도 금세 정이 들었다. 저녁으로 먹은 꽃게탕은 땀 흘린 하루의 피로를 달래기에 충분했다. 아들과 나는 말없이 밥을 두 공기씩 비웠다. 짭조름한 국물은 바다의 기억처럼 깊었다. 다음 날 아침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늘엔 검은 구름이 가득했고, 아들은 천둥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전거 타기에 쉽지 않은 날씨였지만, 우비를 입고 출발을 준비했다.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고, 미끄러짐을 막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낮췄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날의 여정은 험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었고, 아들은 다시 ‘끌바’로 언덕을 올랐다. 중간에 버스를 타게 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나 혼자 남아 능동자갈마당까지 달렸고, 앞 드레일러가 고장 나자 직접 수리도 했다. 낙타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나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다. 마지막 여정은 소야도. 떼뿌루 해변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이 섬에도 전설과 전쟁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청정한 해변과 해송 숲,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우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돌아오는 배 안, 서쪽 하늘엔 여전히 먹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달린다’는 것은 단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만은 아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을 새기는 행위다. 덕적도의 자전거 길은 내 다리의 근육보다, 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역사를 기억하고, 책임을 느끼며 달린 이 이틀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살아 있는 수업이었다. 아들과 함께했던 이 여행, 그리고 비 속의 페달질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을 것이다. 덕적도는 이제 내게 단지 섬이 아니다. 침묵 속의 진실을 품은, ‘기억의 섬’이다.
관련영상>>
좋은 글과 영상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