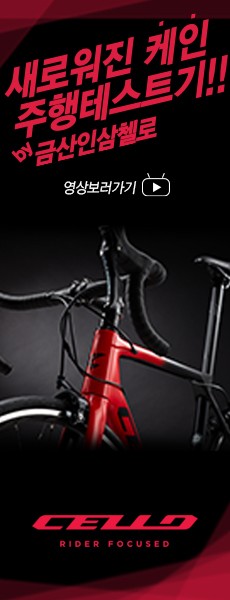세계최초, 북한에서의 라이딩 [더바이크]
세계최초, 북한에서의 라이딩
댄 밀너와 그의 크루는 극도로 접근이 제한되고 통제가 심한 공산국가의 깊숙한 곳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최초의 라이더가 되었다
글/사진 댄 밀너

“미국의 핵무기가 당신의 머리 위를 가리키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가?”
톰은 뱀에 대해 걱정했다. 우린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북한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이라 걱정이 들었다. 뱀은 걱정거리 중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우린 해럴드 필립의 이가는 소리에 일어나야 했다. “따듯한 난로가 필요해.” 지난밤 우리는 매트리스를 피고, 바람을 피해 절벽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 좁은 처마 밑에서 인간 테트리스는 피할 수 없었다. 7명이 좁은 곳에 그나마 마른 곳을 찾아 몸을 구겨 넣었다. 침낭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젠 따듯한 차가 필요했다. 이런 좁은 바위틈에서 밤새 비를 피하면서 잠을 청하는 것은 우리 계획엔 없었다.

어제는 로컬 가이드인 김인국씨를 따라 엄청난 언덕을 올라야 했다. 70세가 다 된 그는 헐렁한 옷을 입고도 엄청난 속도로 올랐다. 우린 자전거를 이고 지고 그를 따라 올랐다. 그는 막대기를 하나들고 마치 요다처럼 우리를 가르치며 앞장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를 따라 걷고 있자면 그야말로 엄치 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달릴 차례다.


차 없는 유토피아
북한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엄청난 일은 아니다. 사실 이데올로기 때문에 고립된 북한은 관광객들의 시야에 벗어나 있다. 하지만 거의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로서, 나는 흥미로운 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었다. 톰 보킨의 가이드 회사인 시크릿 컴파스와 함께하며 상당히 안정적인 여행을 계획했지만 우리는 이 폐쇄적인 국가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은 코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도 했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송건씨는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촬영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와 그의 동료인 엄진송씨는 말끔히 차려입은 가이드로 평양공항에서부터 미니버스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린 밀턴 케인즈의 기획자들이 생각해두었던 코스를 따라갔고 트램과 전기자전거가 달리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공항활주로 만큼 넓은 도로를 따라 초록 색 논과 시골풍경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유네스코 보호지역인 묘향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10여대 정도 뿐. 그리고 평화 자동차 공장의 광고판 정도만 볼 수 있었다.

묘향산의 단풍 숲은 어둡고 쌀쌀했다. 이른 아침부터 자전거를 조립하느라 햇빛 아래서 땀을 쏟아서 그런지 시원하게 느껴졌다. 공기 중에 퍼지는 흙냄새를 따라 우리는 페달을 밟았고 쏟아지는 폭포와 함께 엄청난 경관을 마주할 수 있었다. 두 명의 프로라이더인 맥스와 해럴드는 암벽을 따라 아래로 달렸다. 등산화 대신 일반 신발을 신은 북한의 등산객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영상을 올리진 못할 것이다. 북한은 인터넷이나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우리 안전과 권리를 가이드에게 넘겨준 셈. 미스터 엄과 미스터 박은 아무래도 묘향산의 대자연 보다는 평양의 박물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보였다. 우린 묘향산 정상 부근에서 계획에 없던 비박을 해야 했는데 미스터 엄은 캠핑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아주 얇은 레인코트로 제법 고생을 했다. 아무래도 이번 추억 덕에 그는 다신 캠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 위 기사는 더바이크 2월호에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